



자율주행차와 로봇, 스마트 기기처럼 시각 정보에 기반해 판단하는 기술이 확산되면서, 사람의 눈처럼 넓은 밝기 범위와 복잡한 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차세대 영상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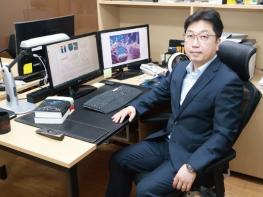
실리콘 태양전지는 이미 이론적 효율 한계에 다가서며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점에 와 있다. 이 경계선을 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연구계와 산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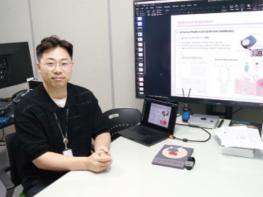
피부는 인체를 감싸는 보호막이자,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 생리적 경계다. 수증기,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수많은 기체 분자가 이 경계를 드나들며 건강과 환경의 변화를 동시에 …

심장은 쉬지 않고 움직인다. 뛰고, 멈추고, 다시 뛰며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이 복잡하고 미묘한 압력의 리듬을 실험실 위에서 구현한다는 것은, 인간 생리의 본질을 정밀하게 다룬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가 한계에 다다른 지금, 필요한 순간에 기능을 바꿔가며 활용할 수 있는 ‘재구성형 전자소자(Reconfigurable device)’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재구성형 전자…

면역항암제가 암 치료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은 지금, 간암은 여전히 그 흐름에서 한 걸음 비켜서 있다.치료제 개발이 활발한 다른 암과 달리, 고형암인 간암은 병리적 복잡성과 면역 회피 기전 탓에 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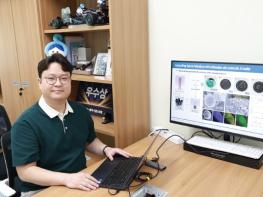
전기차와 에너지저장 장치 보급이 급증하면서, 폐배터리는 더 이상 버려야 할 물질이 아니라 순환시켜야 할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폐배터리를 고성능 소재로 재생하는 일은 까다로운 분리 정제 과정과 환경 부담이 큰 공정에 의존해 왔으며,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많았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윤주영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실시간 오염 입자 측정 시스템은, 실제 플라즈마 공정 환경에서 부품 상태를 정량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기술이다. 이제 반도체 제조 현장에서 품질은 가정이 아닌 수치로, 신뢰는 추정이 아닌 데이터로 말해야 한다. 그 새로운 기준이, 지금 막 실험실을 넘어 산업 현장에 닿기 시작했다.

천연물은 인체에 비교적 안전한 장점이 있는 반면, 일정한 생리활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용화의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천연물의 효능평가와 표준화된 분석법을 통해 과학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연구자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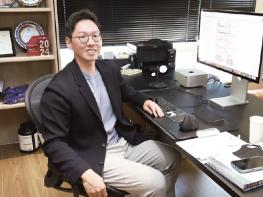
SF 영화 속 장면을 보며 ‘과연 저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란 의심과 기대를 품어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상에 머물던 기술이 실제 과학으로 구현되는 순간, 의심은 확신으로, 기대는 미래를 향한 가능성으로 바뀐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영화 같은 기술이 현실로 다가왔다. 바로 스스로 상처를 복구하는 ‘자가치유 소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