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의 가속화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 국가 R&D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산업 육성 로드맵을 내놓았다.

KIST 첨단소재연구본부 물질구조제어연구센터에서 고분자합성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이성수 박사는 지난 5월 소형 모빌리티에 국한됐던 수소연료전지를 트럭, 지하철, 비행기, 선박 등 대형 모빌리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능 개선하는 연구에 성공했다. 그의 연구 성과는 수소연료전지의 활용처를 넓힘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 모빌리티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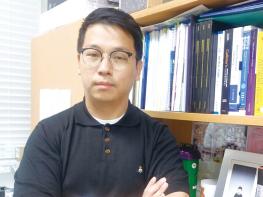
반도체 업계에서는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요구되는 대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나노 공정을 통해 회로의 크기를 수 나노미터(nm, 10억분의 1m)까지 줄여 집적도를 높여왔다. 그러나 기존의 실리콘 기반 전자소자를 더 이상 소형화하기 힘들어짐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연구되었고, 그중에서도 2차원 소재가 주목받고 있다.

영화 ‘아웃브레이크’, ‘컨테이젼’, ‘인페르노’ 등 인류를 위협하는 신종 바이러스를 모티브로 한 영화들은 바이러스의 확산이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실도 이와 마찬가지다. 세계 어느 곳에서 바이러스가 등장해도, 어디로든 전파가 가능한 시대가 된 것이다. 이처럼 이제 세계 인류는 신·변종 바이러스와의 전쟁 한가운데에 서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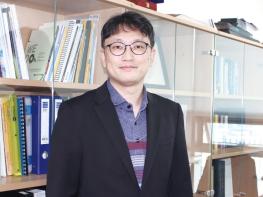
최근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의 정착을 위한 선결 과제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소 저장 및 운송 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한 여러 방법 중 수소를 암모니아로 변환해 저장하는 방법이 가장 주목받고 있지만, 하버-보슈법을 이용한 암모니아 합성은 고온, 고압의 반응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천연가스 등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적 질환을 말한다. 전 세계 인구의 1% 정도가 앓고 있을 만큼 유병률이 높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동안은 조현병의 원인을 대뇌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뤄 왔다. 하지만 성균관대 의과대학 의학과 안지인 교수 연구팀은 대뇌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 ‘소뇌’에 중점을 두고 종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했다.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으로 병원균의 내성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규 항생제들은 슈퍼박테리아에 취약하고, 개발 중인 항생제들은 그람 음성 병원균이 주 표적이기 때문에 그람 양성균인 내성 포도상구균에 대한 신규 항생제 개발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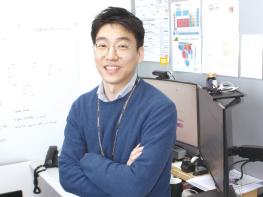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첨단소재기술연구본부 나노포토닉스연구센터에서 나노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김인수 박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다공성 신소재 금속-유기 구조체(Metal-Organic Framework, MOF)는 미세한 구멍이 무수히 뚫려 표면에 많은 양의 물질을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고용량 에너지 저장매체 개발을 위해 MOF를 전극으로 사용하여 전해질을 저장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전기전도성이 없는 MOF에 전기전도성을 부여하고,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해 MOF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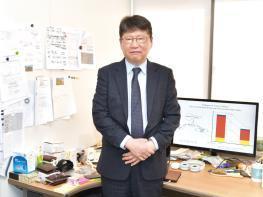
근감소증은 근육량과 근력이 정상보다 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과거에는 노화 현상으로 여겨졌지만, 근감소증이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유발해 신체 전반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근감소증의 정식 질병 코드를 등재했고, 우리나라도 2021년 1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8차 개정을 통해 질병 코드를 부여했다.
 | |